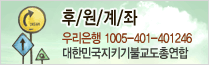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란 임종 게를 남기고 지난주 입적(入寂)한 광우(光雨) 스님의 '작은 장례식'이 불교계에서 화제다.
광우 스님은 한국 현대 불교의 대표적 비구니다. 1939년 만 14세에 직지사로 출가한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 강원(講院)을 입학·졸업, 동국대를 입학·졸업했으며 최고 법계(法階)인 '명사(明師)' 반열에 오른 첫 비구니였다. 1958년 서울 삼선동에 정각사를 창건한 그는 당시로서는 선진적으로 어린이·중고생·대학생 법회와 일요 법회를 개설했다. 김동화 박사 등을 초빙해 최신 불교학 강좌를 열고 학승들을 지원했다.
장례가 화제가 된 것은 기존 불교계의 '장례 문법'과 다른 소박함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 18일 오후 60년간 지내온 정각사 자신의 방에서 입적했다. 이후 동국대 일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노스님이 병원에서 열반해도 사찰로 옮겨 장작을 때는 식의 다비장을 하는 것과는 반대였다. 장례 형식은 조계종 종단장(葬)이나 전국비구니회장(葬)이 아닌 '문중장(門中葬)'이었다. 화장 장소도 서울추모공원이었다.
제자인 정목 스님은 "이미 5년쯤 전부터 '장례는 깨끗하게, 간소하게'를 당부하셨다"고 했다. 출가 본사(本寺)인 직지사로 모실까 묻자 "정진(精進)하는 스님들 발목 묶는다"며 싫다고 했다. "난 대단한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라며 "껍데기(시신)는 그냥 벽제로 가~"라고 했단다. 평생 모아온 보시금은 비구니 승가대학 4곳 등에 기부하라고 유언했다.
빈소를 병원에 마련하라는 말씀은 따로 없었지만 주택가 꼭대기에 있는 정각사에 빈소를 차리면 인근 주민 불편이 뻔한 상황이었다. 생전의 스님은 "동네 사람들 불편하면 안 된다"며 새벽 예불 땐 목탁도 살살 치라고 했다. 영정
사진은 미리 찍었다. 환한 표정의 스님은 자꾸 가슴에 손을 모았다. 제자들이 "손 내리시라"고 하자 "나도 모르게 자꾸 합장이 돼"라고 했다. 5년쯤 전부터 거동은 불편했지만 생활은 깔끔했다. 정목 스님은 "입적하신 날 아침에도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계시다가 고통 없이 떠나셨다"며 "스님이 생전에 미리 배려해주신 덕에 장례를 잔치처럼 치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0156.html